글로벌 시대, 정부의 재정지출이 모두 국내 경제를 살릴까? 수입 유출과 글로벌 구조 속 승수효과의 실체를 짚어봅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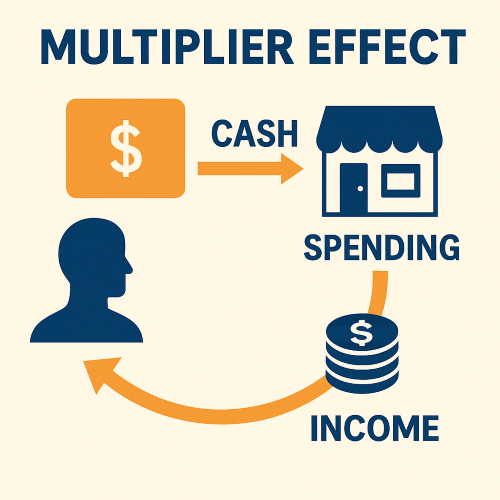
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면, 그 지출은 단지 국내에만 머무를까요? 글로벌 시대의 오늘날, 개별국가의 재정정책은 국경을 넘나드는 구조 속에서 의도치 않은 경제적 유출과 연쇄 작용을 맞이합니다. 과연 정부의 한 푼, 한 푼이 국내 경제를 진짜로 살리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.
승수효과, 다시 보자
승수효과(Multiplier Effect)는 정부가 1만 원을 지출했을 때, 그 돈이 국민소득이나 국내총생산(GDP)에 몇 배의 영향을 주는지를 의미합니다. 하지만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폐쇄경제(Closed Economy)를 전제로 합니다.
글로벌화된 개방경제(Open Economy)에서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흐름이 작용합니다.
- 수입 증가: 국민이 지급받은 돈으로 수입재 소비 → 자금 해외 유출
- 외국 기업의 이윤 회수: 국내 소비 증가 → 다국적 기업 매출 증가 → 해외 본사로 이익 송금
- 환율 반응: 재정지출 → 금리 상승 → 자본 유입 또는 환율 상승 → 수출 타격
개별국가 재정정책의 진짜 딜레마
글로벌 가치사슬(GVC)이 연결된 현대에서는, 어떤 국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해도 그 효과가 일부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. 예를 들어:
-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지급 → 국민이 해외 플랫폼(예: Amazon, AliExpress)에서 소비 → 자국 내 경제 자극은 제한적
- 국가가 인프라 건설에 예산 투입 → 자재와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 → 자국 산업에 돌아오는 이익 감소
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승수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수 기반 강화와 재정정책 설계의 전략화가 필요합니다.
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?
글로벌 시대에도 승수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수입 대체 산업 육성: 국민의 소비가 국내 기업으로 향하도록 유도
- 지역화폐나 특정 플랫폼 연계 지급: 국내 소비에 제한을 두어 자금 유출 방지
- 외국 자본과의 협력 투자: 단독 지출이 아닌 공동 프로젝트로 유입 자본 확보
- 공공구매의 로컬화: 인프라 자재, 인력, 기술을 국내 공급자 중심으로 사용
또한, 재정정책과 통화정책,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국내 체류 효과를 극대화해야 실질적 승수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맺음말
“돈은 썼는데, GDP는 그대로”라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단순한 지출이 아닌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. 글로벌 시대, 재정지출은 국경 밖까지 영향을 주는 외교적 행위이기도 합니다. 한 나라의 재정정책이 자국 산업, 고용, 기술에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는가?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, 승수효과는 국경을 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.